<수필시대> 기획연재 / 미국에서 쓰는 한국문학 (2)
바다에서 꿈꾸는 자여
홍인숙(Grace)
바다를 사랑한다. 내 안에 파도가 많기 때문일까. 망망대해 은빛 비늘의 출렁임을 사랑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바다를 보는 눈은 인생을 보는 눈과 비슷하다는 말도 있다.
송정림 작가는 ‘아침녘 바다를 좋아하면 인생의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석양 무렵 바다를 좋아하면 인생을 낭만적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밤바다를 좋아하면 인생에 당당하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통계적으로 얼마나 맞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바다가 좋다. 태평양 바다, 거대한 물결을 바라보면 수평선 너머 또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두런두런 정다운 바다의 웅성임으로 금세 평안에 젖어든다. 싱그러운 해초 냄새를 안고 잔잔하게, 때론 세차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온몸 구석구석 잠자는 세포를 깨우고 다시 소생시켜주기 때문이다.
나는 힘찬 아침 바다도 좋아하고, 태양이 부셔져 매순간 눈부시게 출렁이는 바다도 좋아하고, 낮게 드리운 회색의 하늘과 바닷새가 드문드문 내려앉은 안개 자욱한 바다도 좋아한다. 그중에도 제일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은 석양녘 바다다. 한낮 찬란했던 태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파도에 침잠하는 그 황홀한 순간과, 일몰 후에 곧바로 찾아오는 장엄한 어둠을 좋아한다. 그것은 마치 종교의식처럼 엄숙하기까지 하다. 그 일몰의 감동을 자주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글로 남기기도 한다.
내가 사는 실리콘밸리는 베이(灣) 주변에 있다고 해서 Bay Area라고 불린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를 가도 쉽게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드라이브 한 시간 이내의,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해변가 주택들도 아름다운 싼타쿠르즈, 자연 경관이 빼어난 몬트레이와 카멜, 해산물이 가득한 항구가 있는 해프문 베이,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살리토, 부자의 도시 티뷰론, 패스트 푸드점 타코벨이 유리 건물로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게 자리 잡은 패시피카. 등등 ..그리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1번 도로를 드라이브하면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다.
그중에도 나는 싼타쿠르즈 바다를 자주 찾는다. 가는 길이 멀고 꼬불거리는 산길이라 와인딩 로드라고 불리는 hwy 17을 넘어가야 한다.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조심조심 가는 길이다.
시어머님은 미국에 오신 후 싼타쿠르즈 바다 근교에 자리를 잡으셨고 20년이 넘게 매일 해변가를 산책하시며 지내시다 돌아가셨다.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하이웨이 17 산길을 오르내렸다. 위험하고 멀미도 나지만 가는 길이 너무나도 수려해서 마치 수십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 황홀함께 빠져 힘든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긴 세월 산길을 넘어 시어머님을 뵈러 다녔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집안까지 온종일 물개 소리,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는 그 싼타쿠르즈 바다 근교에서 삼 년가량 지내기도 하였다. 이런 저런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유인지 나는 싼타쿠르즈 바다와 친숙하고, 지금도 마음이 답답할 때면 그 바다로 달려간다.
몇 년 전에 본국의 젊은 문학교수가 이곳에 와서 문학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몇 명의 미주 문인들이 모여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실력 있는 수많은 시인들과, 재기발랄한 대학생들의 글에 익숙한 그분은 우리들이 자작시를 낭송할 때마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날 발표된 작품 모두에 인색한 시평을 하였다.
내 차례가 되어 자작시 ‘잠든 바다’를 낭송했다, 하루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온종일을 바다에서 보낸 날의 시였다. 한낮엔 은빛으로 세상이 덮이고, 석양 무렵 온통 붉게 물든 바다, 장엄한 일몰 후 분주했던 하루가 파도 속으로 숨어버린 고요한 어둠과 침묵의 바다, 어둠이 부셔져 내려 또 다른 어둠으로 눈부신 바다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발길을 못 돌리던 날의 시였다.
젊은 교수는 내가 낭송을 마치자마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시는 직접 체험한 것을 써야지 바다에 가보지도 않고 머리로만 상상해서 쓰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였다. 시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평이 아니라 억지로 상상해서 지어낸 시로 오해하고 시에 대한 평조차 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좋은 작품을 쓰는 시인은 못되지만, 시인의 자세도 안된 것 같은 취급에 나는 마치 나쁜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무척 당황스러웠다.
보통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즉시 자기 방어도 하고 설명도 해서 난처한 자리를 수습하며 자기 관리를 잘 한다. 하지만 늘 판단도, 언변에도 둔한 나는 항상 제때제때 할 말을 못하곤 집에 와서야 혼자 끙끙대며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는 편이다.
그날도 나는 뜻밖의 시평에 당황하여 시작 배경에 대해 단 한마디의 설명을 못하고 돌아왔다. 함께 한 남편과, 동료 문인들 앞이라 더욱 수치심과 자괴감이 몰려왔다.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했다. 시를 쓰고 싶지도 않았다. 점점 시상도, 시심도 잃어 갔다.
폴란드의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여사는 그녀의 시 ‘선택의 가능성’에서 ‘시를 안 쓰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 시를 써서 웃음거리가 되는 편을 더 좋아 한다’고 하였다.나는 한국의 문학교수와 폴란드의 한 여류시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용기를 내어 쉼보르스카 여사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페러다임 쉬프트, 즉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금세 지옥에서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마음에 평정을 찾으니 서서히 시심이 회복되어 갔고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주관적인 평에 시인이기를 포기하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내 시의 표현이 얼마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였으면 그분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을까 자책하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를 평할 때에 조심하게 되고, 시인을 이해하고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문학상을 두고 작품을 선정하거나, 특별히 작품의 우월성을 가리는 자리라면 당연히 전문 평론가들의 예리한 논평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와 주위의 문인들은 큰 욕심 없이 시가 좋아 시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곳 버클리를 다녀가신 황동규 시인님의 시가 생각난다.
‘외국에서 우리말로 글 쓰는 사람들 / 너나없이 외로운 사람들 / <중략>/ 외따로 핀 꽃들 / 꽃판에서 떨어져 작게 외따로 서 있는 꽃에게 / 잠시 마음을 주어보라 / 마음 온통 저며진 꽃! -
[외따로 핀 꽃들-해외에서 글쓰는 동업자에게] 부분.
‘마음 온통 저며진 꽃!’...얼마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가. 이곳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오랜 타국 생활에서 고국을 향해 가물가물 잊혀져가는 모국어를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해 외로운 밤을 보내는 외따로 핀 꽃들이 많이 있다. 비록 시를 보는 관점은 달라도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오래도록 함께 시인의 길을 걷고 싶다.
가끔씩 삶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바다, 그 넓은 가슴으로 달려가곤 한다. 바다는 이런 나를 말없이 큰 가슴으로 품어 주기 때문이다. 그 가슴에는 휘청거리던 나의 삶, 나의 눈물이 있고, 꿈이 있다. 내게 바다는 위안과 소망이다. 다시 소생하는 힘이며 비상할 수 있는 날개다.
생의 굴곡과 환희와 관조의 세계까지 끌어안고 유유히 출렁이는 바다, 지금도 싼타쿠르즈 바다에는 시어머님의 잔잔했던 그 음성, 미소가 수평선 너머에서 바람결에 실려와 그리움으로 내린다. 나도 어느 한 날, 생을 완성하고 떠난 후 드넓은 태평양 바다에 바닷새로 훨훨 날고 있으리라.
<수필시대> 통권 67호 3/4-2016










 이달의 작가
이달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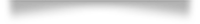



stay tune..
"https://www.youtube.com/embed/N5ddoyfn6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