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묵언의 물선주
2007.01.31 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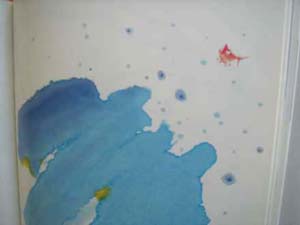
당초부터 뱃머리 밧줄은 팽팽히 감았어야 했다. 일행들의 마음상태도 다잡아뒀어야 하는 것이었다. 행선에 앞서 그것부터 하는 것이 물선주가 할일이고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의 출전채비인 것을-. 그러나 그날 물 선주의 행적은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근동 물 선주는 고기잡이 나갈 때 마다 심신일체를 어찌 다스리고 나갔을까. 물 선주란 배의 실제 오너가 아니라, 고기잡이현장에서 선주를 대신 어로작전을 세우고 어부들이 할일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물 선주는 매번 심신을 정갈케 유지, 판단력에 대실(大失)이 없어야 하며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어부들에게 영(令)이 섰다.
어군탐지가 없었을 때였지만 물 선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폭넓은 바다지식과 연안의 지형과 수질을 죄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옛날 제갈 량처럼 천기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이다. 이를테면 기후이변 가능성을 미리 내다볼 줄 알고, 그 바다의 해류와 달 운행에 따른 조수 변화 파악은 기본이다. 수온변화로 인한 어종의 바뀜과 물고기가 부유하는 물 깊이와 진행방향까지도 예상해야 했으니. 사실상 어군탐지가 할 수 없는 영역도 통달한 사람을 말함이다. 그 성깔 있는 어부들의 솔선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포용력과 때로는 외로운 결단과 흔들림 없는 추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어야 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구루니언(Grunion) 잡는 기사와 멘트를 내보내고 있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 내게 물 선주 비슷한 직임을 추대했다. 이민 초기, 주말마다 바다낚시를 다녔기로 인근해변 특성과 어종별 낚시방법을 조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음력 날짜를 따져 매월 두 차례씩 음력 8일과 23일은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조금’ 한 물때이다. 조수가 제일 많이 나고 드는 ‘한 시’는 여덟 물때인 보름께와 그믐께란 상식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될 듯했다. 구루니언은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캘리포니아 해안 모래사장에 알을 낳으려 몰려온다. 4월과 5월 두 달은 어족 보호를 위한 금어기다. 우리가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시기는 6월과 7월뿐이다.
구루니언은 길쭉한 체형인 모래문지와 비슷하지만 몸통은 어른 검지만하고 길이는 한 뼘 정도다. 은빛 비늘에다 살갗이 투명해 내장까지 비치는 물고기다. 구루니언을 잡는 방법은 특이하다. 으슥한 밤, 해안의 모래사장에 절반쯤의 바닷물이 닿았을 무렵이 적기다. 바람이 없는 날도 태평양 난바다와 맞닿은 이곳 해변은 10미터 정도의 바닷물이 큰 호흡을 하듯 모래사장에 쑥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그 물이 올라올 때 구루니언이 떼를 지어 따라 올라왔다가 모래사장에 남아 꽁지를 박고 알을 낳은 후, 다음 번 물이 올라왔다 내려갈 때 딸려 내려간다. 그런 일이 한참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때를 노치지 않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주워 담으면 된다. 장갑을 끼거나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잡은 량은 제한이 없다.
물 반 잉어 반이란, 엘시노 레이크에선 막대기로 잉어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맨손으로 바닷물고기를 모래사장에서 주워 담다니... 그건 옛 고향 갯마을에서 가을밤 썰물이 많이 나갔을 때, 횃불을 들고 발목 깊이 바닷물에서 어리벙벙하게 놀고 있는 낙지며 게를 손으로 잡거나 그물쪽자로 떠올리는 것 보다 쉽지 않은가. 그리고 여름날 심한 적조를 견디지 못해 마구 해변으로 밀려오던 물고기를 건졌던 것보다 손쉬울 듯싶었다.
출어는 주중 어느 밤이면 좋으련만, 사람들의 사정상 토요일 밤 시간이어야만 했다. 드디어 D데이 밤 10시. 한 집에 모여 있던 일행의 자동차들이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켰다. ‘크리스탈코브 팍’ 인근의 해변도로변에 우리 일행의 자동차들은 다닥다닥 주차를 했다. 여섯 가구 부부들과 몇 집에선 아이들까지 따라와 형형색색의 가장행렬 같았다. 그런데도 의논이나 했던 것처럼 많은 구루니언을 담아갈 커다란 들통 한 개씩은 다들 들고 왔다.
유월 하순의 밤바다는 별세계였다. 하늘과 바다에서 빛나고 있는 보석들의 광채만으로도 바닷물과 젖은 모래바닥은 뚜렷이 구분됐다. 한낮의 소음은 잠들어버렸고. 오르내리는 바닷물의 지느러미 스치는 소리와 모래알 바퀴 굴리는 소리만 귓가에 붓질을 했다. 무균 산소 보다 더 알싸한 밤공기 맛과 발바닥을 간질이는 물살의 장난기에 취해 그저 발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했다. 모태 양수 안의 태아 때를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맨발로 물새 떼처럼 물가를 들락거렸다. 랜턴 불을 들고 앞장서서 물속을 걸어가도 물이 흐려지지 않는 모래의 정화 능력에 감탄하며 내가 뭣 하러 여기 왔는지를 나도 잊었으리라.
그때였다. 구루니언 한 마리가 모래사장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지 않는가. 너무 일찍 나타난 구루니언. 해조음을 배면에 깔고 젖은 모래바닥에서 춤추는 요정의 몸동작이 저리도 날렵하고 싱싱할까. 옥비녀에서 해빙된 파란 바닷물이 생명의 원천임을 다시 한 번 알려주듯 율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냥 두고 오래 보고 싶었다. 그러나 다음 물이 곧 들어오기 전에 아이 하나를 불렀다. 제 들통에 그것을 주워 담은 아이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 소리는 수평선 저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아하. 이걸 어쩌나. 내 기고만장은 잠시뿐. 번쩍 정신이 돌아온 물선주의 직임. 물 선주는 전장의 지휘관에 다름 아니다. 병법서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나는 그만 창조주의 오묘에 넋이 나가있었나 보다. 타임머신을 타고나려 옛 고향 갯마을에서 횃불을 들고 발목 깊이 바닷물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일까? 천관의 집으로 주인을 태워간 김유신장군의 애마 같은 실수를 내가 범해버렸으니 어이가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과 쏘아버린 화살을 어쩐담.
구루니언 주력부대가 모래사장에 한참 상륙하고 있을 때라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저들의 통제능력은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잡히면서도 계속 올라온다고 했다. 그러나 주력부대가 상륙 감행을 하지 않았을 땐 바다 속 주력 진영에서 척후병 몇 마리씩을 모래사장에 올려 보내 탐색전을 펼친단다. 그러다 꼭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구루니언 주력부대가 상륙한다고 했다. 그 때까진 불빛을 보이거나 물속을 걷거나 웅성웅성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더 더욱 척후병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누가 구루니언을 지각없는 어물이라고 얕보겠는가.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우쭐댔던 사람치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게다. 사자가 생쥐 한 마리를 잡는데도 온 정성을 다 쏟는다고 했는데 나는 어떠했는가. 구루니언의 지능지수(知能指數)에도 못 미치는 패장! 한곳의 모래사장에서 잡지 못하면 그 다음 모래사장에 가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일했던 생각. 그러나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피하는 구루니언은 아주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상륙을 중지하는 치밀성을 알지 못했다. 어쭙잖은 물고기 몇 마리 잡는데도 치열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면밀한 관찰과 자료수집에다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글 씀도 그러리.
구루니언 주력부대의 상륙 때까진 우리는 딴 곳에 모여 있으면서 이따금 역 척후병을 보내 모래사장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 후회는 앞지르지 못하는 것. 한군데가 꼬이면 다른 데서도 잘못되는 연쇄반응이 따르지 않던가. 자동차마다 붙어있는 주차위반 벌금티켓. 그 소문은 그 다음날로 내게 되돌아왔다. 여포 창날 같은 험구의 옛 낚시 친구들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이 사람아, 조사(釣師) 체면이 있지 그래. 혹여 망둥이 낚시를 갔어도 그건 아닌데, 구루니언을 주워 담으려고 밤바다 모래사장에 가다니. 쯧쯧”......
비록 나는 풍어의 만족을 일행들에게 안겨주지는 못했어도 밤바다의 안온한 품안에서 호사를 즐겼다. 느슨하게 풀려 있은 내 삶의 끈도 팽팽히 감았는데 그런 걸 어찌 다 말하랴. 그저 조가비처럼 입 다물고 있다 해파리처럼 벙긋이 웃어주면 물선주의 대답이 될까.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4 | {수필} 인디언의 옛 토담집에서 | 박봉진 | 2007.01.31 | 639 |
| 13 | {수필} 산자의 계곡 데스벨리 | 박봉진 | 2007.01.31 | 567 |
| 12 | {수필} 아즈텍의 숨구멍 | 박봉진 | 2007.01.31 | 420 |
| 11 | {수필} 밤낮의 꽃 5각선인장 | 박봉진 | 2007.01.31 | 510 |
| 10 | {수필} 낮의 꽃 패션푸룻 | 박봉진 | 2007.01.31 | 505 |
| 9 | {수필} 밤의 꽃 야래향 | 박봉진 | 2007.01.31 | 599 |
| 8 | {수필} 개에 따라붙은 부정어를 생각하며 | 박봉진 | 2007.01.31 | 485 |
| 7 | {수필} 탐진강의 돌베개 찾아 떠난 친구에게 | 박봉진 | 2007.01.31 | 482 |
| 6 | {수필} 검지로 매듭 잇기 | 박봉진 | 2007.01.31 | 442 |
| 5 | {수필} 여자의 섬의 물돌이 | 박봉진 | 2007.01.31 | 418 |
| » | {수필} 묵언의 물선주 | 박봉진 | 2007.01.31 | 839 |
| 3 | {수필} 하현 반달 | 박봉진 | 2007.01.31 | 612 |
| 2 | {수필} 우애의 샘 | 박봉진 | 2007.01.31 | 496 |
| 1 | {수필} 백목련 한 그루를 심어놓고 | 박봉진 | 2007.01.31 | 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