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우지 못한 편지
2010.12.24 04:29
지금, 나를 너를 추억한다. 일 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다 꼭 이맘때가 되면 너의 생각이 나를 휘두른다. 크리스마스에는 너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솔직히 말해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라 이 음악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은 언제나 먼 태평양을 건넌다.
“난 ‘Oh, Holly Night’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어도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아.”라던 너. 난 ‘Pet Boone'의 [White Christmas]를 들어야 그해의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낸 기분이라고 떠들었지. 매사에 우리는 참 다른 점도 많았고, 그런가하면 같은 점, 또한 많았던 사이였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었나보다. 방금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Oh, Holly Night’이 흘러 나왔단다. 변함없이 또 너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지.
낙엽 떨어진 모습에 쓸쓸함을 서로에게 보이던 우리. 길가에 지고 있는 코스모스가 너무 가엾다는 말에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던 너. 거리를 거닐다 보도 불럭에 구두굽이 빠져서 한참을 배꼽을 잡고 굴렀던 모습. 문득 떠오른 노래 한줄기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네가 갑자기 흥얼거려 둘이서 마주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던 우리. 특별히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통하던 사이. 막연히 길을 가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면 그 다음 동작이 어떤 것이지 알아 서로가 착착 맞아들어 갔던 그 날들. 정말 꿈만 같구나.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난 그 기억에 사로잡혀 뭔지 모를 허전함과 우울함에 쌓였단다. 그것이 고국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고, 너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르지. 너와 함께 깔깔거리며 웃던 때가 그립단다. 너 알고 있니? 지금 나는 그때의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걸 말이야. 지금 나의 웃음은 그냥 입술 끝만 살짝 올리는 거야.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웃음은 아니란다. 경쾌한 웃음을 웃을 수 없는 내 삶이다.
마찬가지. 울음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형편이구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앞에서 보는 그 모습과 뒤에서 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른 것을 느낄 때는 참 슬프다.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안경과 단추장수’이야기를 알고 있지?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고 안경을 산 젊은이는 결국 남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나서 마음에 상처만 가득히 안았다지. 그래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단추로 바꾸었다고 하드구나. 정말 잘 한 것이지. 내 앞에도 ‘안경과 단추’를 파는 사람이 나타난 다면 난 단연코 단추를 고를 것이야. 남의 마음을 본다는 거, 참 상처가 될 때가 많아. 특히 이민생활이라는 게 말이야. 내 마음을 보이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을 보이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음이니. 아니, 솔직히 내 마음을 보이는 것도 두려워. 내속을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어야 할까봐. 그냥 모든 것을 속으로 삼키고 혼자지내는 게 편해.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단다. 화가 나도 속으로 삼키고, 우울해도 혼자서 가만히 해결하고. 그러다보니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단다. 외롭지 않은 날은 도리어 불안해. ‘이래도 괜찮은가...?’하고. 늘 외로움과 우울함을 액세서리로 지니고 다녀. 목젖이 보이도록 입을 활짝 열고 웃어보고 싶어. 내 속을 열어 한없이 한없이 우울함과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어. 넓은 바다를 향해 외쳐보고도 싶어.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이미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익숙해진 내가 갑자기 입을 열게 될 것 같지가 않구나. 내 입속에서 염해두고 봉해두었던 그 이야기들, 그 아픔들. 때로는 그런 것들을 서리서리 풀어내고 싶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내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 떼 내려야 떼 내지지 않을 것 같아. 지체를 때어낼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다. 이제다시 너를 만나도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네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을지도 몰라. 내 속을 털어내는 법을,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쓸쓸함도 우울도 그냥 혼자 안고 가려고.
좀 전에 네가 좋아하는 ‘Oh, Holly Night’을 들었으니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들으며 너를 생각하마. 보고 싶다. 많이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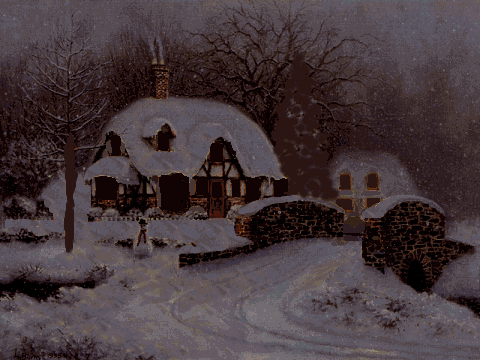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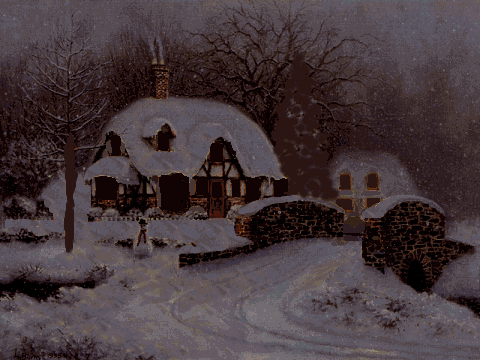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319 | ○ 나이아가라 폭포 | 이주희 | 2010.12.27 | 84 |
| 8318 | 무서운 세상 | 정국희 | 2012.10.19 | 59 |
| 8317 | 스키드 마크 | 이월란 | 2010.12.26 | 82 |
| 8316 | 自慰 또는 自衞 | 이월란 | 2010.12.26 | 93 |
| 8315 | 폐경 | 이월란 | 2010.12.26 | 86 |
| 8314 | 투어가이 | 이월란 | 2010.12.26 | 84 |
| 8313 | 한파 | 이월란 | 2010.12.26 | 90 |
| 8312 | 세모의 꿈 | 이월란 | 2010.12.26 | 86 |
| 8311 | 영혼 카드 | 이월란 | 2010.12.26 | 85 |
| 8310 | 엘리와 토비(견공시리즈 87) | 이월란 | 2010.12.26 | 83 |
| 8309 | 그리움이 | 이월란 | 2010.12.26 | 88 |
| 8308 | 남편 죽이기 | 이월란 | 2010.12.26 | 86 |
| 8307 | 끝이 안 보이는 욕심 | 노기제 | 2010.12.27 | 88 |
| 8306 | 이브의 풍경 | 이상태 | 2010.12.26 | 101 |
| 8305 | 밤 일까 | raphaelchoi | 2010.12.26 | 87 |
| 8304 | 노송(老松) | 안경라 | 2011.03.05 | 43 |
| 8303 | 봄 안개 | 정용진 | 2010.12.26 | 91 |
| 8302 | ‘렘브란트의 포옹’ 이 생각나는 계절/'이 아침에' 미주 중알일보 | 조만연.조옥동 | 2010.12.25 | 94 |
| » | 띄우지 못한 편지 | 이영숙 | 2010.12.24 | 103 |
| 8300 | 특별한 선물 | 신영 | 2010.12.23 | 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