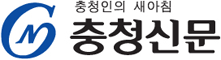|
김우영 작가의 한국어 이야기-25
해콩, 햇과일, 햅쌀, 젖
충청신문 김우영 siin7004@hanmail.net 2015.6.22(월)
| |||||||||||||||||||||||
수필
2015.06.21 11:30
김우영 작가의 한국어 이야기-25
조회 수 413 추천 수 0 댓글 0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89 | 시 | 바다를 보는데 | 강민경 | 2014.05.25 | 208 |
| 988 | 시 | 아침의 여운(餘韻)에 | 강민경 | 2016.03.19 | 208 |
| 987 | 사모(思慕) | 천일칠 | 2005.04.26 | 209 | |
| 986 | 전지(剪枝) | 성백군 | 2007.01.18 | 209 | |
| 985 | 암벽을 타다 | 박성춘 | 2007.10.14 | 209 | |
| 984 | 시 | 밑줄 짝 긋고 | 강민경 | 2019.08.17 | 209 |
| 983 | 시조 |
코로나 19 – 접혔던 무릎 세워 / 천숙녀
|
독도시인 | 2021.08.29 | 209 |
| 982 | 시조 |
낙법落法 / 천숙녀
|
독도시인 | 2021.11.29 | 209 |
| 981 | 철로(鐵路)... | 천일칠 | 2005.02.03 | 210 | |
| 980 | 불멸의 하루 | 유성룡 | 2006.03.24 | 210 | |
| 979 | 하나를 준비하며 | 김사빈 | 2007.10.06 | 210 | |
| 978 | 미음드레* | 이월란 | 2008.04.28 | 210 | |
| 977 | 차원과 진화 - Dimension & Evolution | 박성춘 | 2012.01.28 | 210 | |
| 976 | 청량한 눈빛에 갇혀 버려 | 강민경 | 2012.05.19 | 210 | |
| 975 | 밑줄 짝 긋고 | 강민경 | 2012.11.01 | 210 | |
| 974 | 시 | 낙엽 한 잎 | 성백군 | 2014.01.24 | 210 |
| 973 | 시 | 6월 바람 / 성백군 | 하늘호수 | 2015.06.17 | 210 |
| 972 | 시 | 개여 짖으라 | 강민경 | 2016.07.27 | 210 |
| 971 | 시 | 철쇄로 만든 사진틀 안의 참새 / 필재 김원각 | 泌縡 | 2019.05.31 | 210 |
| 970 | 시조 |
달빛 휘감아 피어나는 들풀향기 / 천숙녀
|
독도시인 | 2021.06.07 |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