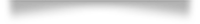글 욕심에 대하여.
오랜만에 컴퓨터의 문서 보관함을 여니 2년여라는 짧은 기간에 제법 많은 글을 썼다. 단편 소설도 몇 편 썼고 수필, 시, 평론에 시조, 한시까지 장르 가리지 않고 꽤 많은 글을 썼다. 그간 먹고살기 위해 일도 계속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가운데 어떻게 저처럼 많은 글을 쓸 시간이 있었는지 도무지 의아스럽다. 뿐이랴, 소설토방, 문학캠프 등 각종 문학관련 모임이란 모임은 빠지지 않고 다 나갔고 그밖에 친구들과 술 마시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글을 쓴다기 보다 짧은 시간에 거의 붓이 가는 대로 생각과 감정을 쏟아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이리라. 그래서 대부분 한 번 쓴 글은 맞춤법 교정 정도나 본 후 거의 수정 없이 적당한 곳에 올린 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처럼 글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쩍 글을 쓰기가 힘들어진다. 예전처럼 빨리 글을 쓸 수가 없다. 아니 써 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 몇 주씩 뭉개고 있다가 종국에는 전체 글을 지워버린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혹시 누구의 말처럼 내 뇌에 저장되어 있던 글창고가 바닥이 난 것일까? 아니면 평생 한 번 찾아온다는 시마(詩魔)가 벌써 왔다 간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알았다. 내게 부쩍 글 욕심이 생긴 것이다.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다. 예전 같으면 벌써 다 쓰고 올릴 곳부터 찾았을 터이나 지금은 글을 다 쓰고 나서 도대체 내가 무슨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일까?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읽을 만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글인가? 글은 또 왜 이리도 산만하단 말인가? 온갖 회의가 다 들어 종국에는 지워버리고 마는 것이다.
몇 년 전 우리 조상의 선비정신에 흠뻑 취했던 때가 있었다. 우리 선조들의 기상과 풍류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었다. 우리 조상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웬만한 무명의 선비조차도 수백 편이 넘는 시를 쓰는 등 한 때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시인들의 나라였다. 송강 정철 같은 대문인의 경우 2천 편이 넘는 시를 썼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시를 쓰는 시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단 한 수의 절창(絶唱)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단 한 수의 절창을 얻는다면 지금까지 썼던 수천 편의 시를 아낌없이 불살라도 좋을 만큼 일생에 걸쳐 오직 한 수의 절창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를 썼던 것이다.
나도 어느 날부터 그러한 글을 쓰고 싶다. 단 한 편의 시, 단 한편의 수필이나 단편소설에 불과할 지라도 정말 절절이 끓는 글을, 그 글을 읽고 독자의 가슴이 데일 만한 그러한 글을, 글이 살아있어 한 번 글을 읽은 사람은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살아갈만한 글을, 그러한 글을 쓰고 싶은 것이다.
정민 선생의 <한시미학산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 우리 조상들의 글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
고려 때 김황원이란 이가 평양 감사가 되어 부벽루에 올랐는데 누각에 걸린 고금의 제영이 성에 차는 것이 없는지라 시판을 다 떼어 불사르게 하고는 하루 종일 난간에 기대어 괴로이 읊조렸으나 다만
장성 한 면에는 넘실넘실 강물이요.長城一面 溶溶水
넓은 벌 동편에는 점점이 산일레라.大野東頭點點山
라는 두 구절을 얻고는, 뜻이 고갈되어 마침내 통곡하고 돌아왔다는 일화가 전한다.
역시 고려 때 유명한 시인 강일용은 백로를 가지고 시를 지으려고 비만 오면 짧은 도롱이를 입고 성문 밖 천수사 남쪽 시내 위로 가서 황소 등에 걸터앉아 이를 관찰하였다. 날마다 수염을 꼬며 고심하기 백일이 되어 문득
푸른 산허리를 날며 가르네 飛割碧山腰.
라는 한 구절을 얻고는 “오늘에야 고인이 이르지 못한 것을 비로소 얻었다. 뒤에 마땅히 이를 잇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뒤에 이인로가 “교목의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占巢喬木項”를 그 앞에 얹어 짝을 맞추었다.
조선 중기의 시인 신광한은 일찍이 낮잠을 자다가 소나기가 연꽃 화분을 지나는 소리에 잠을 깨어 문득
연잎 쏟는 빗소리에 꿈이 서늘터니 夢凉荷瀉雨
라는 시구를 얻었다. 그 뒤 몇 해가 지나도록 그 대구를 얻지 못하여 , 율시 한 수를 이루었으나 그 행만은 빈칸으로 비워두고 반드시 절묘한 대구를 채우려 하였다. 박란이 이 말을 듣고 "바위에 이는 구름 옷이 젖는다(衣濕石生雲)“가 어떠냐고 했으나 신광한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이 구절의 대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상의 예화들은 선인들이 시 한 구절에 대한 애착과 노력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준다.
글에 잔뜩 욕심을 부리다 보니 묘한 반발심 같은 것도 생긴다. 도대체 이 글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글을 잘 쓰고 싶은 것일까? 글에 우리 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얄팍한 자기 허영심의 발로는 아닌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썼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읽어줄 것인가?
허난설헌은 27세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수 천 편의 시를 썼으나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시를 모두 불살라달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그녀의 시는 동생인 허균이 친정에 남은 시들을 모은 불과 수십 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조격으로 추앙받는 프란츠 카프카의 경우도 죽을 때 그의 절친한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그의 작품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유언하였다. 그의 말을 듣지 않은 브로트가 없었다면 아마도 현대 소설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카프카가 없는 현대 소설을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 사람만큼 글 욕심이 많은 시인이나 작가들을 고금에 걸쳐 보지 못했다. 남들은 생애 단 한편도 못 쓸 빼어난 작품들을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수십 편을 쓰고도 죽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 모조리 자신의 작품을 불살라달라고 했던 허난설헌과 카프카. 왜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글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삶의 무거움과 예술(작품)의 가벼움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예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결코 인생을 카피하거나 초월할 수 없다는 뼈저린 자각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러한 글쓰기 자체가 부질없는 욕망을 드러내는 일이란 것을 인식한 것일까?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요즘 너무나 글들이 많다. 수많은 글들이 각종 문예지나 출판물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좋은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읽으나마나 한 글, 읽을 필요도 없는 글, 아니 오히려 읽어서 해로운 글들이 도처에서 판을 치고 있다. 아!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내 평생에 위와 같은 글 하나만 남길 수 있으면 나는 천상병처럼 알코올중독자여도 좋고 거지처럼 평생을 살아도 좋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다. 열 번을 죽었다 산다한들 이런 시를 못 쓴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난 너무도 순수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세파에 닳고 닳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렇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 끝나는 날, 난 가서 절대로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노래하지 못하리라.
오랜만에 컴퓨터의 문서 보관함을 여니 2년여라는 짧은 기간에 제법 많은 글을 썼다. 단편 소설도 몇 편 썼고 수필, 시, 평론에 시조, 한시까지 장르 가리지 않고 꽤 많은 글을 썼다. 그간 먹고살기 위해 일도 계속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가운데 어떻게 저처럼 많은 글을 쓸 시간이 있었는지 도무지 의아스럽다. 뿐이랴, 소설토방, 문학캠프 등 각종 문학관련 모임이란 모임은 빠지지 않고 다 나갔고 그밖에 친구들과 술 마시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글을 쓴다기 보다 짧은 시간에 거의 붓이 가는 대로 생각과 감정을 쏟아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이리라. 그래서 대부분 한 번 쓴 글은 맞춤법 교정 정도나 본 후 거의 수정 없이 적당한 곳에 올린 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처럼 글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쩍 글을 쓰기가 힘들어진다. 예전처럼 빨리 글을 쓸 수가 없다. 아니 써 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 몇 주씩 뭉개고 있다가 종국에는 전체 글을 지워버린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혹시 누구의 말처럼 내 뇌에 저장되어 있던 글창고가 바닥이 난 것일까? 아니면 평생 한 번 찾아온다는 시마(詩魔)가 벌써 왔다 간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알았다. 내게 부쩍 글 욕심이 생긴 것이다.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다. 예전 같으면 벌써 다 쓰고 올릴 곳부터 찾았을 터이나 지금은 글을 다 쓰고 나서 도대체 내가 무슨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일까?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읽을 만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글인가? 글은 또 왜 이리도 산만하단 말인가? 온갖 회의가 다 들어 종국에는 지워버리고 마는 것이다.
몇 년 전 우리 조상의 선비정신에 흠뻑 취했던 때가 있었다. 우리 선조들의 기상과 풍류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었다. 우리 조상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웬만한 무명의 선비조차도 수백 편이 넘는 시를 쓰는 등 한 때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시인들의 나라였다. 송강 정철 같은 대문인의 경우 2천 편이 넘는 시를 썼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시를 쓰는 시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단 한 수의 절창(絶唱)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단 한 수의 절창을 얻는다면 지금까지 썼던 수천 편의 시를 아낌없이 불살라도 좋을 만큼 일생에 걸쳐 오직 한 수의 절창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를 썼던 것이다.
나도 어느 날부터 그러한 글을 쓰고 싶다. 단 한 편의 시, 단 한편의 수필이나 단편소설에 불과할 지라도 정말 절절이 끓는 글을, 그 글을 읽고 독자의 가슴이 데일 만한 그러한 글을, 글이 살아있어 한 번 글을 읽은 사람은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살아갈만한 글을, 그러한 글을 쓰고 싶은 것이다.
정민 선생의 <한시미학산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 우리 조상들의 글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
고려 때 김황원이란 이가 평양 감사가 되어 부벽루에 올랐는데 누각에 걸린 고금의 제영이 성에 차는 것이 없는지라 시판을 다 떼어 불사르게 하고는 하루 종일 난간에 기대어 괴로이 읊조렸으나 다만
장성 한 면에는 넘실넘실 강물이요.長城一面 溶溶水
넓은 벌 동편에는 점점이 산일레라.大野東頭點點山
라는 두 구절을 얻고는, 뜻이 고갈되어 마침내 통곡하고 돌아왔다는 일화가 전한다.
역시 고려 때 유명한 시인 강일용은 백로를 가지고 시를 지으려고 비만 오면 짧은 도롱이를 입고 성문 밖 천수사 남쪽 시내 위로 가서 황소 등에 걸터앉아 이를 관찰하였다. 날마다 수염을 꼬며 고심하기 백일이 되어 문득
푸른 산허리를 날며 가르네 飛割碧山腰.
라는 한 구절을 얻고는 “오늘에야 고인이 이르지 못한 것을 비로소 얻었다. 뒤에 마땅히 이를 잇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뒤에 이인로가 “교목의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占巢喬木項”를 그 앞에 얹어 짝을 맞추었다.
조선 중기의 시인 신광한은 일찍이 낮잠을 자다가 소나기가 연꽃 화분을 지나는 소리에 잠을 깨어 문득
연잎 쏟는 빗소리에 꿈이 서늘터니 夢凉荷瀉雨
라는 시구를 얻었다. 그 뒤 몇 해가 지나도록 그 대구를 얻지 못하여 , 율시 한 수를 이루었으나 그 행만은 빈칸으로 비워두고 반드시 절묘한 대구를 채우려 하였다. 박란이 이 말을 듣고 "바위에 이는 구름 옷이 젖는다(衣濕石生雲)“가 어떠냐고 했으나 신광한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이 구절의 대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상의 예화들은 선인들이 시 한 구절에 대한 애착과 노력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준다.
글에 잔뜩 욕심을 부리다 보니 묘한 반발심 같은 것도 생긴다. 도대체 이 글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글을 잘 쓰고 싶은 것일까? 글에 우리 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얄팍한 자기 허영심의 발로는 아닌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썼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읽어줄 것인가?
허난설헌은 27세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수 천 편의 시를 썼으나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시를 모두 불살라달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그녀의 시는 동생인 허균이 친정에 남은 시들을 모은 불과 수십 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조격으로 추앙받는 프란츠 카프카의 경우도 죽을 때 그의 절친한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그의 작품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유언하였다. 그의 말을 듣지 않은 브로트가 없었다면 아마도 현대 소설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카프카가 없는 현대 소설을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 사람만큼 글 욕심이 많은 시인이나 작가들을 고금에 걸쳐 보지 못했다. 남들은 생애 단 한편도 못 쓸 빼어난 작품들을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수십 편을 쓰고도 죽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 모조리 자신의 작품을 불살라달라고 했던 허난설헌과 카프카. 왜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글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삶의 무거움과 예술(작품)의 가벼움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예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결코 인생을 카피하거나 초월할 수 없다는 뼈저린 자각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러한 글쓰기 자체가 부질없는 욕망을 드러내는 일이란 것을 인식한 것일까?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요즘 너무나 글들이 많다. 수많은 글들이 각종 문예지나 출판물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좋은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읽으나마나 한 글, 읽을 필요도 없는 글, 아니 오히려 읽어서 해로운 글들이 도처에서 판을 치고 있다. 아!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내 평생에 위와 같은 글 하나만 남길 수 있으면 나는 천상병처럼 알코올중독자여도 좋고 거지처럼 평생을 살아도 좋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다. 열 번을 죽었다 산다한들 이런 시를 못 쓴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난 너무도 순수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세파에 닳고 닳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렇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 끝나는 날, 난 가서 절대로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노래하지 못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