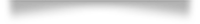3월 27일 일요일 저녁 7시(엘에이시간).
인문학적 성찰과 이론의 지위: 세계를 읽는 다양한 방법
강연: 오민석(시인·문학평론가·단국대 교수)
구조주의 문학이론이 등장한 1950년대 이후 문학이론(literary theory)은 가히 백가쟁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문학이론은 단지 문학에 대한 담론으로 멈추지 않고 학제간(學際間interdisciplinary) 담론으로 확산되면서 ‘현대 사상의 박물관’으로 진화·발전해왔다. 문학이론은 이제 ‘문학’에 대한 이론을 넘어서서 ‘세계’에 대한 이론이 되어가고 있으며, 문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귀를 기울이게 되는 ‘지성 담론’이 되었다. 문학이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문학이론이 ‘문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문학은 다름 아닌 인간의 ‘모든 것’을 다루는 작업이라는데 있을 것이다. 먼 고대의 음유시인의 시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은 철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말을 걸어왔으며,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왔다. 문학이 말 그대로 인간과 세계의 ‘모든 것’을 다루므로, 문학이론 역시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이론’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학이론의 역사는 ‘시인 추방론’을 내세운 플라톤의 『국가 The Republic』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본격적인 최초의 문학이론서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The Poetics』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론의 역사는 사실상 문학의 발생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학이론은 넒은 의미에서는 “1차 언어(the first-order language)”인 문학 텍스트에 대한 모든 메타 담론, 즉 “2차 언어(the second-order language, metalanguage)”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설명하며 혹은 평가하는데 동원되는 모든 방법론(methodology)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방법론이란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문학 텍스트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패러다임, 관점, 입장, 각도, 코드(code), 틀거리(framework)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학이론을 이렇게 문학 텍스트를 읽는 패러다임으로 정의할 경우, 문학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해진다. 간단히 말해 동일한 대상도 어떤 패러다임으로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과학 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1962)에서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내용이다. 쿤은 과학 발달의 역사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의 역사임을 논증하였다. 그가 말하는 “과학 혁명”이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인식론적 단절’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패러다임의 역사는 과학 혁명의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문의 역사는 패러다임들의 변화, 충돌, 발전의 역사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학문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그 자체인 것이다.
패러다임(이론)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데에 있다. 아무런 입장이나 관점이 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는 없다.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항상 특정한 패러다임이 개입되며 주체가 읽어낸 모든 것은 바로 이 패러다임을 경유한 결과인 것이다. 만일 이론(패러다임)을 거부하는 입장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또 하나의 이론(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체는 사실상 ‘패러다임의 노예’들이다.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동일한 대상도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개입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은 마치 인식의 프리즘, 색안경 같아서 대상을 자신의 코드대로 변화시킨다. 모든 대상은 그것에 들이대는 패러다임의 코드에 의해서 재(再)코드화(recoding) 된다. 물자체는 항상 물자체 그대로 존재하지만, 주체가 대상을 마주할 때, 주체의 인식의 자장 안에서 물자체는 사라진다. 물자체는 더 이상 물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패러다임에 의해, 다시 말해 해석의 화학반응에 의해 변형된다. 문제는 이렇게 패러다임에 의해 재코드화된, 다시 말해 해석된 대상을, 주체가 물자체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팩트는 없다. 오로지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There are no facts, only interpretations)”라는 니이체(Friedrich Nietzsche)의 유명한 명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팩트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팩트를 ‘읽는’ 특정한 패러다임, 관점, 입장, 이론들이다. 문제는 주체가 대상을 직면하는 순간, 이런 패러다임들이 한 치의 예외도 없이 바로 작동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진리가 대상 자체의 속성에서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은 일정 정도 착각이다. 진리를 생산하는 것은 놀랍게도 상당 부분 대상 자체가 아니라 패러다임이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진리를 생산한다. 가령 ‘5·18 광주항쟁’이라는 팩트는 사라지고 없으며, 남은 것은 오로지 언어적 구성물, 즉 텍스트로서의 광주항쟁 밖에 없고, 따라서 광주항쟁에 대한 모든 논의들은 텍스트로서의 그것에 대한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해석을 생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항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패러다임들이라고 말이다.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패러다임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사실 때문에 패러다임에 대한 공부 자체가 불가피해진다. 결국 주체에게 남은 것은 패러다임의 선택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인생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인생관’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문학 텍스트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들, 관점들, 패러다임들이 존재하며, 이것을 문학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상을 바라보는 무수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그것들 중에는 다른 관점보다도 대상을 상대적으로 더욱 정확히 읽어내는 관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 관점들의 위계를 알려면 관점들의 속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문학이론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앞에서 문학이론의 학제적 성격을 이야기했거니와, 문학이론을 공부하는 일은 단지 문학에 대한 이론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문학이론들은 문학비평뿐만이 아니라 문화비평, 영화비평, 현대철학 등 다양한 영역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 이론들에 대한 공부는 꼭 전문가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지적 해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론들의 공부는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 다루게 될 대표적인 ‘현대 문학이론’을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문학이론이 이론으로서 본격적인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구조주의 이후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조주의 이전에 이론의 전사(前史)로서 영미의 신비평(New Criticism)과 러시아 형식주의(Russian Formalism)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비평과 러시아 형식주의는 복잡한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문학이론의 정초를 세웠다. 1920년대를 거쳐 1940~5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한 신비평의 화두는 ‘비평의 객관성(the objectivity of criticism)’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었다. 이는 신비평 이전 영미권의 비평이 대체로 객관성을 결여한 인상비평 혹은 전기론적 접근(biographical approach) 등, 텍스트 내부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추론’ 성향의 비평들이 대세였음을 거꾸로 보여준다. 신비평가들은 비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텍스트 그 자체(text itself)’를 볼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텍스트 바깥의 작가나 독자, 사회·역사적 맥락에 토대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텍스트 자체에서 모든 텍스트 해석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 혁명(1917) 전후에 태동하여 1921~25년 사이에 짧은 전성기를 누렸던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화두는 문학과 ‘비(非)문학(non-literature)’을 구별시키는 문학 고유의 자질, 즉 ‘문학성(literariness)’의 해명이었다. 그들은 문학을 문학이게끔 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문학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문학은 형식, 곧 ‘표현’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들은 ‘일상 언어’와 ‘시적 언어’를 구분하였으며, 시적 언어의 특징을 ‘낯설게 하기’에 있다고 보고 시적 언어의 특징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1950년대 유행하기 시작한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발상을 문학이론에 적용한 것이다. 구조주의자들은 개별 작품의 특수성을 설명하기보다는 무수한 개별 작품들의 근저에 있는 보편적 규칙들의 발견에 주력하였다. 이는 개별 발화들(individual utterances)로서의 파롤(parole)이 아니라, 개별 발화의 근저에서 그것들을 생산하고 지배하는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랑그(langue)를 언어학의 궁극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소쉬르의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들은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나가는 문학의 ‘통시적(diachronic)’ 측면 보다는 시간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학의 ‘공시적(synchronic)’ 구조를 연구하는 데에 주력했다.
러시아 형식주의의 뒤를 이어 1930~40년대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의 팽팽한 긴장 속에 발전했던 바흐친 학파의 문학이론(the Bakhtin school)은, 사상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에 토대하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달리 하부구조의 문제를 언어에 대한 사유와 결합시킨 매우 독특한 이론으로 현대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언어와 사회·역사적 현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바흐친 학파가 볼 때 모든 언어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또한 모든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현상에 항상 언어의 끈들이 개입한다. 따라서 이들이 볼 때, 언어는 사회변동의 가장 민감한 지표이며 언어 안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한다. “언어야말로 계급투쟁의 각축장”이라는 명제는 이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것이다. 이들이 볼 때, 기호 안에서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므로 기호(언어)는 근본적으로 ‘대화적(dialogic)’이고, ‘다성적(polyphonic)’이다. 모든 언어는 이렇게 이질적 목소리들의 대화적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어성(異語性 heteroglossia)’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에서 시작된 마르크스주의는 그 안에 다양한 갈래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그들이 볼 때, 문학작품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도 역사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에 대한 모든 해석은 사회·역사적인 맥락과의 총체적인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볼 때 문학작품은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반응의 결과이며, 이런 의미에서 무균질의 진공상태에서 생산되는 문학은 없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는 문학의 사회성, 역사성, 이데올기성의 해명을 중시한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론 혹은 이론 행위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단지 해석해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라는 마르크스의 명제는 사실 모든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과제이기도 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비평과 해석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로 보며, 비평이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들의 마련을 중시한다.
196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 문학만이 아니라 철학, 사상의 영역에서 큰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는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구조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연장 혹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할 때 포스트구조주의의 “포스트(post)”는 “후기(後期 after)”의 의미를 갖게 되고 “후기구조주의”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구조주의를 내파(implosion), 즉 내부에서 해체시킨 이론이기도 하다. 이 경우 “포스트”는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탈(脫)구조주의”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포스트구조주의는 “포스트”는 “후기”와 “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후기구조주의”나 “탈구조주의”라고 번역할 경우, 나머지 하나를 놓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후기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양쪽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원어 그대로 “포스트구조주의”라 부르기로 한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각자 서로 다른 용어로 주체와 세계 그리고 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이들이 볼 때 ‘통합된 주체(unified subject)란 없다. 모든 주체는 ’분열된 주체(split subject)’이다. 일차적으로 주체는 의식/무의식 혹은 이성/욕망으로 분열되어 있다. 또한 언어체계와 무관한 주체는 없다. 주체는 언어체계 안에서 ‘기표(signifier)’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기표로서의 모든 주체들은 하나의 ‘기의(signified)’를 갖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한대의 기의를 갖는다. 그리하여 하나의 잘 맞추어진 초점 같은 주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언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투명한(transparent)’ 매체가 아니다. 언어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대상을 왜곡하고 굴절시킨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표현을 빌면, 언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주는 “평면거울이 아니라, 찌그러진 거울 혹은 깨진 거울”이다. 언어가 대상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arbitrary)’이기 때문이다. 셋째, 궁극적이고도 절대적이며 유일한 진리, 대문자 진리(Truth)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개념적 가설로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분열된 주체와 대상을 왜곡하는 언어를 경유해 그것을 인지하거나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볼 때, 이 세계는 무수히 다양한 상대적 진리들, 소문자 진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문학 텍스트 안에도 어떤 ‘단일하고도 고정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문학 텍스트의 의미는 항상 ‘미결정(indeterminacy)’의 상태이며,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표현을 빌면 “의미(meaning)가 아니라 의미화 과정(signification, meaning in process)을 전달하는 것”이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The Wretched of the Earth』(1961)에서 시작된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식민 지배와 피식민 종속으로 특징 지워지는 근·현대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는 식민지에 대한 군사적, 물리적 지배를 넘어서 인간과 세계를 총괄하는 가치의 기준을 식민 종주국인 1세계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1978)은 수천 년에 걸쳐 서양이 동양을 어떻게 타자화해왔으며 자신들의 입장에서 동양에 대한 허구와 환상을 만들어왔는지 잘 보여준다. 이는 문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어서, 가령 정전(正典 canon), 즉 훌륭한 문학의 기준은 늘 백인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되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자(the colonizer)의 시각이 아니라 피식민자(the colonized)의 입장에서 문학작품을 거꾸로 읽을 것을 주장한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대부분 알제리, 인도, 팔레스타인 등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제3세계 출신의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도되어왔는데,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더욱 복잡한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자반응비평(reader-response criticism)은 의미생산의 주체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작가에서 독자로 옮겨놓은 이론이다. 독자반응비평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생산의 최종적 주체는 독자이다. 동일한 텍스트도 상이한 독자들에 의해 상이한 의미로 해석된다. 독자반응비평은 문학 텍스트가 독자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종의 ‘독자학(讀者學)’을 세워나간다. 독자들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다. 독자들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텍스트를 상이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해석 코드를 따라가기도 한다. 독자들은 작가가 의도하고 가정한 “내포적 독자(implied reader)”(볼프강 이저 Wolfgang Iser) 혹은 “모델 독자(model reader)”(움베르토 에코 Umberto Eco)의 의무에 충실하기도 하지만, 작가가 만든 해석의 회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독특한 의미망을 생산하기도 한다.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독자의 개인적 해석과 독자가 속해 있는 “해석 공동체들(interpretive communities)”의 코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겨난다. 공동체의 해석 코드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무수한 개별 독자들의 해석 코드들이 축적된 것이며 동시에 그 코드들의 공분모이다. 개별 독자들은 공동체의 해석 코드와 자신의 코드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를 생산한다.
페미니즘(feminism)은 세계가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전체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세계의 한 부분인 문학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문학작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문학사의 형성까지 일관되게 관통되어온 ‘남근중심주의(phallocentrism)’를 읽어내고, 여성의 입장에서 문학텍스트를 거꾸로 읽을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이 볼 때, 여성들은 작가로서 자신을 세워나가기에 남성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가령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여성들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입과 “자기만의 방(one’s own room)”을 가져야하는데,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경제력과 독립적 공간을 잘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의 주장처럼 남성 연구자들에 의해 문학사가 기술(記述)되면서 탁월한 여성작가들이 문학사에서 종종 지워진다. 페미니스트들은 문학사의 전통에서 사라진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복원해내면서 ‘여성의 글쓰기’라는 독특한 영역을 탐구해낸다. 페미니즘은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 포스트구조주의 등 인접한 사상들과 만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데, 최근에 이를수록 남성과의 대립적, 적대적 관계 속에서 여성 혹은 여성의 글쓰기를 논하기 보다는 여성의 몸, 여성 고유의 언어, 여성 고유의 글쓰기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더욱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1980년대 이후에는 퀴어 이론(queer theory)과 접점을 이루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문학이론이 무엇인지, 왜 문학이론이 중요하며, 왜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현대의 대표적인 문학이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략적인 지형도를 그려보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위에서 요약한 현대문학이론들은 문학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위시한 대중문화 비평, 미디어 비평, 정치 비평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감히 말하건대 현대문학이론에 대한 이해는 (문학을 포함한) ‘세계’를 읽어내는 다양한 패러다임을 익히는 일에 다름 아니다. 소위 ‘발상의 전환’이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패러다임들은 다른 종류의 ‘맹목(blindness)’이 보지 못한 ‘통찰(insight)’을 제공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통찰의 이면에 맹목을 생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이론은 ‘총체적(total)’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부적(local)’ 정당성만을 갖는다. 한 마디로 말해 ‘모든 것을 정확히 읽어내는 창(window seeing all things clearly)’은 없다. 우리는 수많은 문학이론들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통찰을 생산하고 맹목의 지점(blind point)을 지워나가는 도정에 있을 뿐이다. 이론들은 저마다 맹목과 통찰의 이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폴 드망(Paul De Man)의 주장처럼 때로 맹목과 통찰은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다.













 장윤녕(스텔라장) 시인 아트작품 전시회
장윤녕(스텔라장) 시인 아트작품 전시회
 미주문협 2월토방-고영범 작가
미주문협 2월토방-고영범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