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끝의 정원
2007.08.21 0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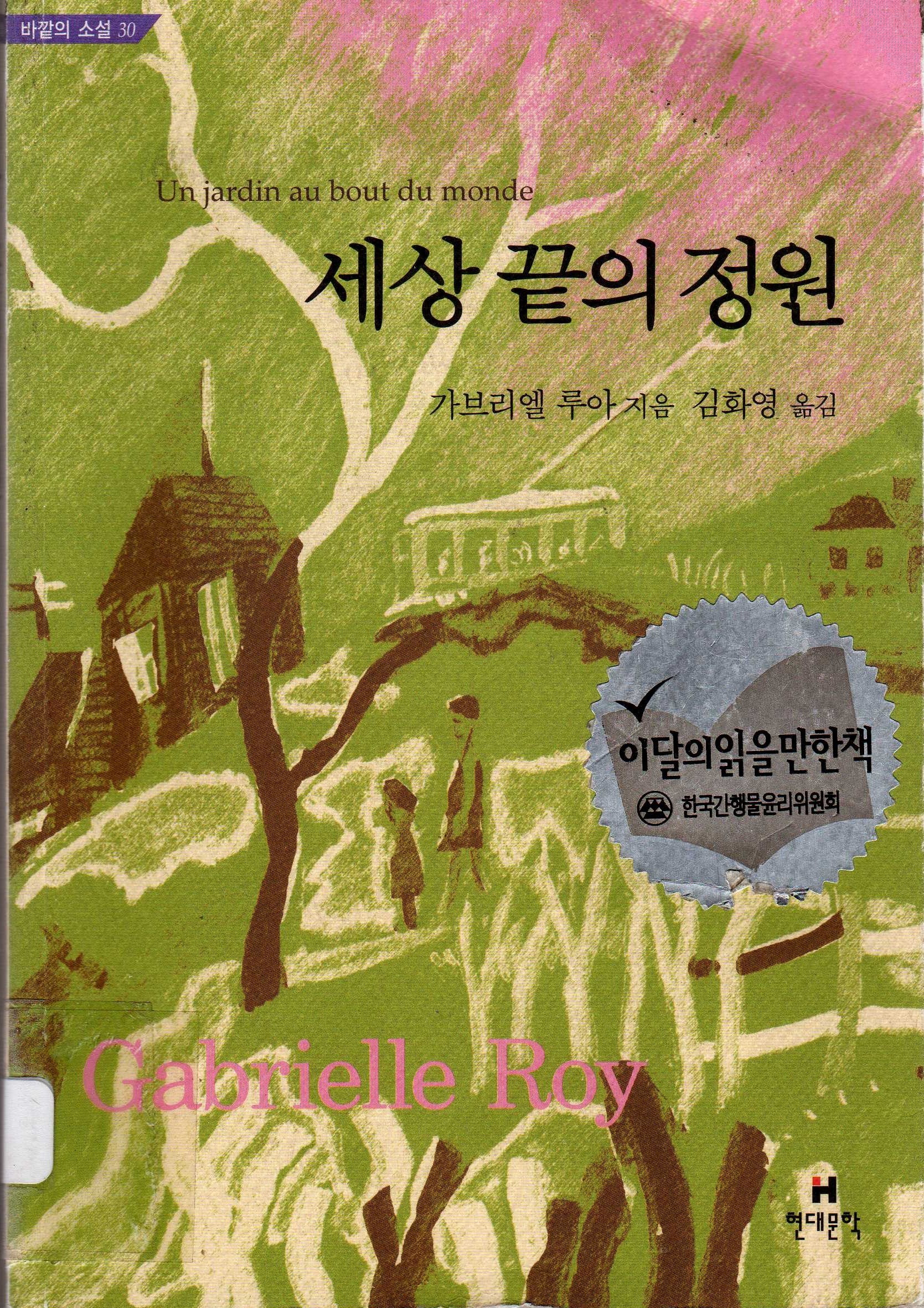
가브리엘 루아[-g-alstjstkfkd-j-]얼마 전 김화영의 번역으로 읽은 가브리엘 루아의 중단편집, <세상 끝의 정원>은 아름다웠다. 오랜만에 깊은 고요와 고독을 만났다. 캐나다 평원에 가득한 바람소리, 자신의 생각밖에는 들리지 않는 끝없는 고독, 그 생각마저 바람에 휩쓸려 뒤죽박죽이 되고 부서지는 그 깊고 깊은 고독을 만났다. 에드워드 하퍼의 그림들이 떠오른다. 햇빛 가득한,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지워질 듯 한없이 고독한 사람, 집, 나무, 거리들. 외부의 소음을 문득 잊고, 인간의 내면으로 통하는 깊은 렌즈 속을 들여다 본 기분이다. 덕분에 '글'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다. 잘 쓴 글을 보면 나도 쓰고 싶어지는 것. 내 안의 공명판이 울기 때문일 것이다.
가브리엘 루아(Gabrielle Roy)는 1909년에 태어나 1983년에 사망한 캐나다 작가이다. 한때 교사로 일했고, 연극을 공부했으며, 기자로서 캐나다 서부를 여행하며 이민자들의 소공동체들을 소개하는 현장르포를 써내기도 했다. 내가 김화영의 번역으로 읽은 <세상 끝의 정원 Un jardin au bout du monde>에 실린 네 편의 중단편들도 그 시절에 얻은 인상과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표제작 '세상 끝의 정원'이다.
'북부 캐나다 지역의 이를테면 작은 우크라이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코데사보다도 더 먼 곳......' 그렇게 시작되는 이 글은 나를 멀고 끝없는 평원으로 불러낸다. 그 '황량하고 메마르기가 이를 데 없는 한구석에서 그 찬란한 꽃들이 피어 있는 광경', 즉 마르타의 정원을 불쑥 만나는 것이다.
마르타 야람코는 오래 전 고향 우크라이나를 떠나 캐나다 앨버타 주의 볼린에 정착한 이민이다. '자신만만하고 무모할 정도로 대담'했던 젊은 시절, '미지의 나라에 대한 열광적인 믿음'만으로 '거긴 어딘가에 있는 허공'이리라는 어머니의 만류도 듣지 않고 겁먹은 남편을 부추겨 이민을 떠나왔던 그녀는 이제 자식 셋을 모두 키워 도시로 떠나 보내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색해져 버린 늙은 남편 스테판과 함께 황폐한 농지에 남았다. 오래 전 그들이 '고독의 땅속으로 더 멀리 전진하여 마침내 어느 봄날 인간들과 그들의 숙명에 대한 끝없는 몽상인 양 그들의 눈앞에 전개'되어 있던 기나긴 풀밭. 그러나 그 농지 한 구석에는 그녀가 키워낸 정원이 있다. 오두막에서 야영하던 이민 초기, 그녀의 남편이 사십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일용품을 사러가면서 '그 밖에 또 필요한 것이 있나?' 물었을 때, 그녀는 필요한 수많은 일용품들에 대한 생각 끝에 그들의 오두막을 포위하다시피 한 헐벗은 벌판을 바라보았다. 그때 낯선 땅에 빈손으로 떨어진 자신들만큼이나 헐벗고, 고독했던 벌판에 그녀는 꽃을 심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남편이 구해 준 씨앗을 뿌려 시작한 그 정원을 그녀는 매년 정성껏 꾸미고 가꾸어 왔다. 이제는 늙고 병들어 힘이 다한 그녀가 제멋대로 자라도록 놓아두었지만, 꽃들은 제각기 더욱더 찬란한 빛으로 피어나 정원을 채웠다.
이 작품은 벌판 끝에서 마르타의 정원을 만난 화자가 그 감회를 서술하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앞부분과 소외감과 혼자 남을 두려움에 분노를 터뜨리는 남편의 내면을 묘사한 짧은 부분을 제외하면 정원과 정원을 포함한 평원, 그리고 그 속에 떠도는 바람, 또는 자신의 넋과 나누는 마르타의 대화, 또는 독백으로 채워져 있다.
나는 그 대화 속에서 깊은 고독을 만났다. 그 잔혹하리 만치 드넓고 황폐한 그녀의 평원에서는 자질구레한 일상과 그에 관련된 감정들이 겉치레처럼 느껴진다. 지위도 명칭도 모두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곳은 죽음, 또는 죽음도 삶도 아닌 허무와 맞닿은 삶의 가장자리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신도 성자도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 오히려 외로움과 고난에 지친 사람들에게 속수무책 도움도 못 주고 무기력하게 잊혀져 가는 성자들을 돌보는 것은 마르타라는 늙고 병든 여자이다. 마르타는 고향에서 데려온 그 성자들의 형상을 모셔둔 작은 예배당을 청소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위안이나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다. '신 역시 한낱 꿈이요 고독이 만들어낸 욕망에 불과한 것일까' 하고 혼자 뇌일 뿐, 그저 작은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들어 있던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보다 정원이 먼저 죽기를 바란다. 돌볼 사람이 없는 정원이 남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예기치도 않게, 무심하고 그 무심과 제 안의 고독이 지나쳐 심술맞게만 느껴지던 남편이 정원을 돌보고 또 그녀에게까지도 옥수수죽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그녀는 조용히 꿈꾸듯, 환상을 보듯, 더 넒은 평원으로, 훌쩍 그 거대한 허무 속으로 나서듯 죽음을 맞는다.
이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서건 삶에 대한 믿음을 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인지?'
황폐한 평원, 깊고 깊은 고독 속에서 꽃을 피워낸 마르타의 정원은 바로 그런 것, 삶에 대한 작은 믿음 같은 것이다.
작가는 일찍이 현장르포 기자로 여행할 때 이 소설에 대한 소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르러서야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마르타처럼 많은 것을 벗어버린 후에야, 그래서 오롯이 홀로 평원에 나선 후에야 그 보석 같은 정원의 빛을 제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덕분에 마음 한구석에 작은 정원을 얻은 듯싶다. 가끔 그 정원을 들여다보면 삶에 대한 믿음이 알록달록, 부서질 듯 가냘프나 사라지지 않는 꽃잎으로 흔들리고 있으리라.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 |
Stones from the River
| 김혜령 | 2007.08.21 | 322 |
| » |
세상 끝의 정원
| 김혜령 | 2007.08.21 | 441 |
| 6 |
Night
| 김혜령 | 2006.11.04 | 305 |
| 5 |
The Time Traveler's Wife
| 김혜령 | 2006.07.14 | 369 |
| 4 |
Madelein is Sleeping
| 김혜령 | 2006.07.14 | 301 |
| 3 | The Member of the Wedding | 김혜령 | 2005.03.09 | 351 |
| 2 | 허난설헌 | 김혜령 | 2005.02.17 | 662 |
| 1 | The Baron in the Trees | 김혜령 | 2005.01.20 | 320 |